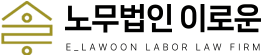[행정해석]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1본문
1. 질의요지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각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만 규정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에 가산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정하면서,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의 문언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육아휴직과 달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을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과 달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취지는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하려는 것인바(각주: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가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용례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311 (2025. 7. 7.)]